
|
실수를 연발하는 족속이지만,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나오면 풀어서 설명하는 습관을 들인다. 모르는 용어를 들으면 그 뜻을 물어보거나 자료를 찾아본다. 적어도 그렇게 하라고 배운다.
과문해서인지 나는 ‘기고효과’라는 단어를 최근에서야 처음 봤다. 한 기사는 ‘에쓰오일 측은 2016년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고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른 기사는 ‘유진투자증권은 2일 풍산에 대해 ‘기고효과에 따른 이익 모멘텀 위축’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였다‘고 전했다.
뜻을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어가 생소했다. 기저효과는 영어로 ‘base effect’를 옮긴 용어다. 기저(基底)라는 단어로 번역된 base는 비교 대상이 되는 바탕을 뜻한다. base는 의미상으로 baseline을 줄인 단어라고 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baseline은 비교의 기준치·기준점을 뜻한다.
그래서 base effect는 비교 기준치가 낮을 때에도 쓰지만 높은 경우에도 쓴다. 이는 ‘인베스토피디아’라는 투자용어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전은 "1년 전의 월 물가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월 인플레이션율 수치에 나타나는 왜곡"이라고 base effect를 설명한다. 즉, 기저효과라는 용어는 1년 전 물가가 너무 낮았을 때에도 활용되지만 1년 전 물가가 매우 높았을 경우에도 쓰이는 것이다. 이 이치는 지표나 수치가 물가가 아닐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앞 두 기사에서 ‘비교 대상 수치가 너무 높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뜻에서 쓴 기고효과는 모두 기저효과로 써야 맞다. 기본적으로 ‘기저’라는 단어는 있지만 ‘기고효과’에 해당하는 ‘기고’는 없는 단어다. 짐작컨대, ‘기고’라는 낱말을 만든 사람은 ‘기저(基底)’의 반대말로 ‘기고(基高)’를 궁리해낸 듯하다. 그이는 한자를 오해했다. 기저의 저(底)는 ‘낮을 저(低)’가 아니라 ‘밑’을 뜻한다. 영어의 base에 해당한다. 요컨대 ‘기저’에는 반대말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기저’의 반대말은 ‘기고’가 아니다.
‘기고효과’라는 억지 용어는 누가 처음 지어냈을까. 기사를 기준으로 확인해봤다. 최초의 기사는 2005년 3월 24일치로 검색된다. ‘반면 기아차 수출단가는 기고효과로 3.1% 하락한 1만1,355달러를 기록했다고 소개’라고 나온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전하는 기사다. 이로 미루어 보면, 기고효과는 애널리스트가 만든 용어로 추정된다.
물론이다. 언론계에도 책임이 있다. 애널리스트가 틀리게 썼더라도 기자가 걸렀으면 이렇게 통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가 썼어도 언론매체 데스크와 교열부에서 고쳤으면 이토록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스스로도 ‘기고효과’라는 용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한 온라인 언론매체는 2006년 2월 22일, 국내 언론사 중 두 번째로 이 용어를 활용해 "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기고효과"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 서비스업 품질도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자를 활용한 지식 유통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활자매체는 물론이요, 문자를 통해 일상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금융회사의 자료에도 정확하지 않은 서술, 틀리게 구사된 용어, 오타와 비문이 자주 눈에 띈다. 좋은 내용이더라도 반듯한 형식을 갖춰야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바쁜 세상, 뜻이 통하면 된다’는 반박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한 용어와 정제된 표현으로 서술하면, 그 차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은 금세 파악하는 그 차이는 완성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그 태도에서 또 많은 것이 비롯된다.







![[2026 통신 전망] 5G시장 포화에 알뜰폰 추격 압박…빅3, AI로 답 찾을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103.c1ec7ab30d754cf085d317bdc14e1d18_T1.jpeg)


![[2026 산업 기상도] AI 훈풍 반도체 ‘수출 맑음’, 보호무역·캐즘에 소재·완성차 ‘흐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1.5d0acc91aba24c3491cc224784be5dc2_T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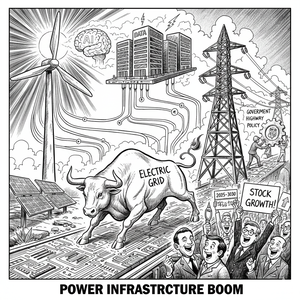

![[EE칼럼] 에너지와 경제성장, 상관을 넘어 인과를 묻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EE칼럼] ABCDE + FGH](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고환율 정부 대책 변명만 남았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다크 팩토리와 어쩔수가 없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50326.21b3bdc478e14ac2bfa553af02d35e18_T1.jpg)
![[데스크 칼럼] 검증대 선 금융지주 지배구조, 증명의 시간](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8.c6bb09ded61440b68553a3a6d8d1cb31_T1.jpeg)
![[기자의 눈] 수요 예측 실패 신공항, ‘빛 좋은 개살구’ 못 면한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9.e0265cfa33b54f1bb40c535f577994b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