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동국제강 당진공장, 세아제강 포항공장(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원료값 부담이 높지 않음에도 국내 철강업계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는 모양새다.
2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철광석값은 t당 104.12달러로 1월5일 대비 약 27% 낮아졌다. 유연탄값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t당 90달러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포스코 철강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 실적을 밑도는 등 부진이 예상된다. 현대제철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으나, 2021~2022년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를 비롯한 전방산업 부진이 지속되는 탓이다. 실제로 3월 다섯째주 중국 열연·철근 내수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2.8%, 2.0% 하락했다.
지난달 중국 철강 PMI가 44.2를 기록하는 등 수치가 회복되지 못하는 중으로 현지 철강사 재고도 '역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철근 유통가격도 낮아지면서 전체 제품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로 물량을 강하게 밀어내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79만t에 달하는 중국산 열연강판이 국내로 수입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0% 늘어난 수치다. 일본산 열연강판도 엔저를 등에 업고 221만7000t(+29.9%) 가량 국내로 들어왔다.
중국 내에서 감산 행보가 포착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에게 수혜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조강생산량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바 있고, 판재류를 비롯해 국내로 유입되는 제품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글로벌 조강생산량(3억960만t)이 전년 동기 대비 3.0% 불어나는 등 공급과잉도 지속되고 있다.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인도(+10%)와 튀르키예(+35%)를 비롯한 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 확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사들을 상대로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철강이 92로 집계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평균을 밑도는 수치다.
한국무역협회도 철강·비철금속제품의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90.7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물류비 상승과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등이 수출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업종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철강 업종의 난항이 점쳐졌다.
3월 철강 업황 PSI는 67로 제조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SI가 100 미만이면 해당 월의 경기가 전월 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본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4월 전망 PSI도 100을 기록했다. 3월 수준의 경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것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이 철강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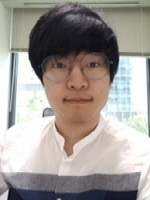

![[이슈+] ‘소액주주 행동’ 본격화에도 주주행동주의 제도 미비 여전…국감 ‘뜨거운 감자’](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0929.bcee5fb5ca3d4fce92af0c86115100e4_T1.jpg)


![[주간 신차] 아우디 전기 플래그십·현대차 쏘나타 부분변경 동시 출격](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07.b7a91dd22c234582a0489bb68886e4d0_T1.jpeg)
![[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2…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해법 제시](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08.02310b2264eb42e8a0d277c237a144be_T1.png)






![[EE칼럼] 철강산업 탈탄소화, 값싼 수소가 필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40521.f1bf8f8df03d4765a3c300c81692086d_T1.jpg)
![[EE칼럼] 금융투자자가 바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29.d692b778844b41eb93ab731e1faf138e_T1.jpg)
![[장박원 칼럼] 트럼프 식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술수](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03.c87f7b2679194a2db0189cfb0ccc62ae_T1.jpg)
![[이슈&인사이트]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과 국민경제 성장](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40405.216378e10c3244be92f112ed66527692_T1.jpg)
![[데스크칼럼] ‘신뢰’라는 가장 값비싼 보안](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28.146b22eef4274f56b58c030181a629cb_T1.jpeg)
![[기자의 눈] ‘코스닥의 민낯’, 솜방망이 처벌이 남긴 대가](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30.df4cf6f987b448ae9928b19f88e49ba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