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의 금융시장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할 때 빠지지 않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 지역은행의 위기는 이번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교훈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시작으로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등 미국 내 지역은행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한때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금인출 등 은행권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쳤고, 전문가들의 경고는 기우에 그쳤다. 은행들의 파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은행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시멈춤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부동산PF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최근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저금리 시기에 국내 금융사들이 앞다퉈 뛰어든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대규모 공실 문제까지 얽히고설키면서 시한폭탄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4년 전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중순위 대출에 나섰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보증인 파산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약 90%를 회계상 손실로 상각 처리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PF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운용사는 2018년 총 3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을 결국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외 PF의 위기는 곧 국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대출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회수 실패, 그로 인한 일부 소규모 저축은행의 정리 역시 불가피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총체적 위기를 직면한 금융당국은 바로 관리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가동한다고 한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역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츰 족쇄를 풀고 있다.
다시 미국의 사례를 보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과 지역은행 붕괴로 중소 규모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은행 간에 추가적인 인수합병(M&A)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발언이다. 미국은 옐런 장관 자신이 아는 다른 국가보다 많은 은행이 있고, 결국 은행부문의 더 많은 합병은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은 모든 은행을 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당국 시각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대출 부실에 따른 새마을금고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과거와 달리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상당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M&A 역시 구조조정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 금융사의 PF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한 지금, 시장기능에 따라 부실화된 일부 금융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한계사업장의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금융부실 가능성 최소화, 건전성 강화에 대한 당국의 대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mediasong@ekn.kr


![[환경포커스] 황사와 함께 세균도 날아온다…평소 5~6배로 늘어나](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2.5629a7dc5da244df9fec107bc0b3789b_T1.jpg)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도 58.2%…4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2.552bfc261c09453e9a0bded6bf1de060_T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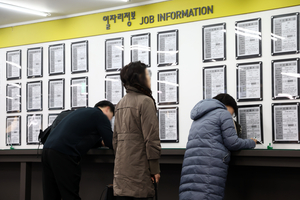


![[여헌우의 산업돋보기] 中 TCL, 삼성 누르고 출하량 1위…‘TV 왕좌’ 노린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1.faeb34bfe4074dc2a97857415bfb6748_T1.jpg)





![[김성우 시평] 정책과 시장의 조화가 기회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EE칼럼] 가격이 신호가 될 때 행동이 바뀐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40528.6d092154a8d54c28b1ca3c6f0f09a5ab_T1.jpg)

![[이슈&인사이트] 어록 제조기 시대의 종말](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21.d4a5236841154921a4386fea22a0bee8_T1.jpg)
![[데스크 칼럼] 부동산 개혁, ‘다주택자 잡기’만으로 해결 안 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0.ea34b02389c24940a29e4371ec86e7d0_T1.jpg)
![[기자의 눈] 주주환원이 만든 PBR 1배, 다음은 지배구조](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03.9db479866b4d440e983ca217129dfcfe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