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2.31p(1.24%) 오른 3449.62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10.1원 내린 1378.9원에 마감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곧 반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등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 속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익스포저(노출 비중)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17일 인베스팅닷컴,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전날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해 222.24를 기록, 2021년 2월 종전 최고치(220.64)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MSCI 아태 지수의 상승률은 21%로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블룸버그는 “풍부한 유동성, 달러 약세, 인공지능(AI) 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코스피의 경우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3450선을 돌파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날 장중 4만5000선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고, 대만 가권지수 역시 장중 2만5664.81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베트남의 대표 지수인 VN지수, 싱가포르 ST종합지수 역시 이달에 각각 1711.49, 4375.33까지 급등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경우 신고가는 아니지만 올 들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54.07에 마감했고 홍콩 항셍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35%에 육박한다.
호주 S&P/ASX200 지수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후 현재 8800선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미국발 관세 충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기업들의 이익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는 지난달 공식 발효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의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BNP파리바의 윌리엄 브래턴 아태 주식 리서치 총괄은 “관세 리스크가 향후 실적 기대감이나 밸류에이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시아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일본, 대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티로우 프라이스의 클라렌스 리 선임 포트폴리오 애널리스트 역시 “관세 여파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아시아 및 신흥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중을 줄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지표가 지금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은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주문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이는 관세 발효 전 수출을 앞당긴 결과라는 반론도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마저 예고하면서 아시아 기술 섹터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애버딘 인베스트먼트의 제리 고 투자 책임자는 “아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프랭클인 템플턴의 크리스티 탠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수출과 테크 섹터 기업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수개월간 실적 부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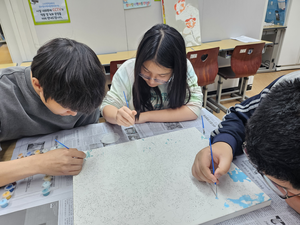

![[EE칼럼] 에너지 전환의 그늘: 취약한 광물·원자재 공급망](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EE칼럼] 대규모 정전… 에너지 고속도로와 가스 터빈 발전](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로봇을 막아 회사를 멈추겠다는 노조](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으로 본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 변화](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325.ede85fe5012a473e85b00d975706e736_T1.jpg)
![[데스크 칼럼] 기업은 고객에, 정부는 기업에 ‘신뢰’ 줘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30년 1조원, 서울시 ‘값비싼 미루기’의 청구서](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30.5049a21f2fc5432ab8fbe28f2439b34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