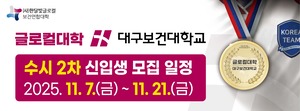|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올 연초 이후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시장에서 62개의 ETF가 청산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 ETF 시장이 포화 상태인 미국과 달리,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상품화가 가능한 자산이 한정적인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투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목 수의 증감만으로 시장 현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양국 간 순자산총액(AUM) 규모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연초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상장된 ETF 중 62종목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같은 기간(26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작년 422개의 ETF가 신규 상장했지만 뉴욕증시 약세가 계속됐고, 운용사들의 비용이 커져 소규모 상품 위주로 청산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테마 ETF들이 다수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ETF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ETF 숫자는 ‘0개’였다. 작년 한 해에도 139개의 ETF가 신규상장될 동안 단 6개의 ETF만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국내 ETF 시장이 걸음마 단계여서 발전 속도가 빠른 데다, 미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점을 원인으로 제기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은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ETF 상장이 승인될 수 없다. 단일·소수종목 주식형 ETF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승인되지 않다가 작년 규제 개선이 있고 나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
또한 국내 증시는 ETF를 비롯한 주식 투자 유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이미 소규모 ETF를 정리하는 단계를 거쳤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ETF 숫자는 지난 2017년 5개, 2018년 7개, 2019년 11개로 비교적 적었지만, ‘동학 개미 운동’이 시작됐던 2020년 29개, 2021년 25개로 급등한 바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ETF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 ETF화 할 수 있는 자산이 한정돼, 애초에 상품 수가 적었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ETF에 대한 투자 수요와 자산화할 만한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국내 ETF의 총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다. 지난 2017년 총 35조6109억원이던 ETF AUM은 5년 연속 증가한 끝에 작년 말 기준 78조5116억원을 기록, 120.47% 늘었다. 이달 18일 기준으로는 무려 93조5122억원으로,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불과 4개월여 만에 15조원이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상장된 ETF 종목 수 역시 현재 총 697개로, 지난 2017년(325개) 대비 두 배 이상이다.
단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ETF 상장폐지 숫자나 상장된 종목 숫자만으로는 시장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의 ETF 종목 수는 약 3000개로 국내 ETF 종목 수 대비 약 4~5배 정도다. 그러나 미국 ETF AUM 규모는 약 7조달러(한화 약 9240조원)로 우리나라의 100배에 달한다. 미국 ETF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인기가 없거나 부실한 ETF 상품이 빠르게 폐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국내 시장이 더 활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뜻이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이미 선진화된 금융투자제도로 ETF AUM 규모가 훨씬 크다"며 "양국 간 상장폐지된 ETF 종목 숫자만으로 시장의 침체나 발전 속도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suc@ekn.kr













![[EE칼럼] 글로벌 공급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EE칼럼] AI의 심장은 원자력, 원자력의 심장은 인재](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신연수 칼럼] 기후변화 대응, 더는 후퇴하지 말자](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1.d106b5fa7dae4b1b8bb0b2996cdd827a_T1.jp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잊혀진 사람’과 유튜브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택](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모니터 속 AI만 버블이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금융에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0707.4f068e7ca63e46c6836a2ff4bd234276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