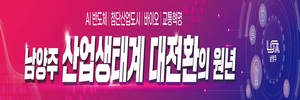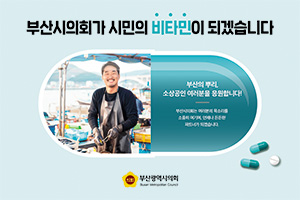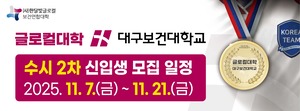|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올해 현재 84.0세로 10년 전인 2012년 81.3세 대비 2.7년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8년보다도 3.2년 높다.
장수는 인간의 축복으로 여겨졌지만, 개인이 예상한 은퇴 이후의 생존 기간과 실제 생존 기간 사이에 차이가 큰 탓에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62세로, 일본(65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른 편에 속한다. 그러나 실질 은퇴 연령은 가장 늦은 72.3세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각종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 빈곤율로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로 제일 높다. 생보협회는 "이는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이 가능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021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로 전년 대비 0.84% 감소했지만, 의료급여비는 62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1% 늘었다.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사적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연금 소득대체율은 아직 부족하다.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을 하회한다.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기금 고갈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생보협회는 "급속한 고령화,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은퇴 후 노후 기간은 연장됐고, 노후 의료비 급증,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고갈 문제도 당장 우리나라에 닥친 현실"이라며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 납입액(연600만원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세제혜택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독] 무안 참사 1주기…국토부·사조위, 블랙박스 먹통에 사라진 ‘제주항공 2216편 궤적’ 3D 복원 추진](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6.463903c54951438aacfec0b1dfa7c5d1_T1.png)

![[주간 신차] 혼다 CR-V 하이브리드, 페라리 ‘849 테스타로사’](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5.f0caad8c702f41a59c772ec6fd8209ed_T1.jpg)
![“부실기업 퇴출 지연, 韓경제 성장 막았다”...GDP 0.5% 손실 [이슈+]](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4.51f07313e864483f97a8a8ca605b503e_T1.jpg)



![[한·미 팩트시트 합의] ‘50% 장벽’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돌파구는 ‘대미투자’](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4.8d0ed65b819e4613b6532e1726f461ec_T1.jpg)



![[EE칼럼] 글로벌 공급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EE칼럼] AI의 심장은 원자력, 원자력의 심장은 인재](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신연수 칼럼] 기후변화 대응, 더는 후퇴하지 말자](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1.d106b5fa7dae4b1b8bb0b2996cdd827a_T1.jp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잊혀진 사람’과 유튜브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택](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모니터 속 AI만 버블이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금융에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0707.4f068e7ca63e46c6836a2ff4bd234276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