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유통업계 공룡인 롯데와 신세계가 중국 사업과 관련해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좌측부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로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유통공룡인 롯데와 신세계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긴급 자금을 올해 2차례에 걸쳐 수혈하며 버티고 있는 반면 신세계 이마트는 철수를 결정하며 현지 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드 보복이 본격화 되면서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며 나머지 점포들도 사실상 휴점 상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는 매출은 거의 없지만 임금 등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올 2분기 중국 롯데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284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인 21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롯데는 올 3월 3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수혈했고 최근에도 340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매출 감소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롯데는 중국 사업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마트나 슈퍼 외에도 백화점, 제과, 월드, 케미칼 등 중국 현지에만 24개 계열사를 두는 등 대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해 왔다.
또한 롯데 계열사 7곳이 참여해 2019년 오픈을 목표로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인 ‘롯데월드 선양’도 있다. 이 곳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국 관리당국의 보복성 점검으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에도 사드 보복이 계속되면 롯데가 결국 중국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 현지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마트는 중국 현지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며 철수를 결정했다.
이는 적자 누적이 주요 원인이지만 사드 사태 여파로 반한 감정이 일어나는 등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한 것도 철수 결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현지 매장이 30개에 육박했지만, 적자가 쌓여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재 6곳만 남은 상태다. 이마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216억 원의 손실을 보는 등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영업적자만 1500억 원이 넘는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스타필드 고양 개장 행사에서 "중국에서는 철수 절차를 밟고 있고 연말이면 완벽하게 철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마트는 중국 매장 5곳을 태국 CP그룹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P그룹은 중국에서 슈퍼마켓 브랜드 ‘로터스’를 운영하며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각 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내에는 철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는 아직 중국 사업에 대해 투자단계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버티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국 공산 당대회 이후 변화에 따라 롯데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유통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심하고 폐쇄적이어서 해외 기업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들 역시 시장에 진출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사회적 네트워크나 인맥 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관시(關係)’ 문화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한섬, 2분기 실적 기저 부담 줄어들 듯…목표가 2.5만원 [NH투자증권]](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508.b2afd3accc074cbfa0735617e64bfdca_T1.jpg)


![조이시티, 신작 출시 연기에 목표주가 ↓[미래에셋증권]](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508.df2d3449bcca4917945fdb2c6d0e289a_T1.png)



![고려아연, 메탈가 상승과 자회사 실적 개선에 주목 [메리츠증권]](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508.775b8ac31eba409ba96950d7ed0ecd9f_T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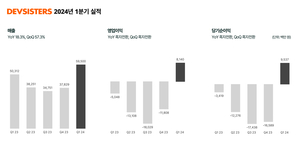

![[김상호 칼럼] 하남시 청소년의회, ‘더불어 숲’ 가자](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506.b2e64187995f46c890024382f61a7175_T1.jpg)
![[이슈&인사이트] 삼성전자에 美 보조금이 독배인 이유](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221.166ac4b44a724afab2f5283cb23ded27_T1.jpg)
![[데스크 칼럼]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책임져라](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506.3090165601654632876b4695ca9b35e6_T1.jpg)
![[기자의 눈] 지역균형 논리에 갇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http://www.ekn.kr/mnt/thum/202405/news-p.v1.20240507.a625ae03615f456ea680c8a974f9d54a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