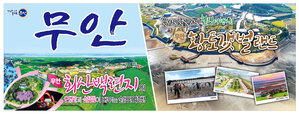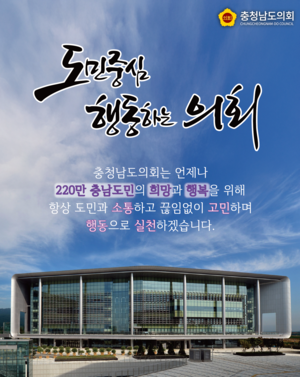![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진제공=연합뉴스] 1](http://www.ekn.kr/mnt/file/cdn/20190930/2019093001001219400045401.jpg)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황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에서 나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원전, 석탄화력 비율을 줄이고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응할 예정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을 포함해 63.8기가와트(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신규 설비 용량의 95%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전에 따르면 변동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총 용량의 50%,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의 22%를 점유하는 데 그친다. 이는 총 발전설비 용량의 7.6%로 총 발전량의 1.96%를 점유하는 수치이다. 현재 국내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률은 IEA의 Phase of VRE Integration 기준 Phase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Phase 1 단계는 ‘재생에너지의 계통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발표된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에 따라 2017년 말부터 분기당 원전 1∼2기(1∼2GW) 수준으로 계통접속 신청이 급증했다.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정책’이란 1MW이하 신재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속용량 초과시 계통보강 비용을 한전부담으로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이에 한전은 일부 소지역 편중에 의한 계통 포화로 변전소 등 설비건설시까지 접속대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신청 용량의 72%가 호남(53%), 영남(19%)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호남 및 영남권 재생에너지 접속신청 집중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31년 기준 호남권은 37.8%, 영남권은 23.8%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별 접속용량 정책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1MW이하는 계통보강 후 접속을 보장하고 ▲송전접속은 규모에 관계없이 계통보강 후 접속 보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송전망 여유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정지역 다수사업자 편중으로 난개발과 대규모 송전망 보강이 유발되자 계통여유지역으로 접속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산화 정책을 개발했다. 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성한 후 계통 여유지역으로 접속하고 REC 차등, 계통용량 사전고시제, 접속비용 차등적용 등 재생에너지 분산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여헌우의 산업돋보기]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빛’인가 ‘빚’인가](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0.d19079801dc542c9abc4030b1aa5e546_T1.jpg)
![[머니+] 일본 기준금리 30년래 최고에도…엔화 환율 더 오른 이유는](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0.ad642d10cb684f159a4fa43e0f4af567_T1.jpg)




![다각화 만능 아니다…금융지주 수익 안정의 ‘전제 조건’ [이슈+]](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9.ee9d97e6e80d452f84159f54b2d0f94e_T1.jpg)



![[EE칼럼] 국산 가스터빈 발전기의 미국 수출에 대한 소고](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EE칼럼] 석유화학 구조조정, 부생수소 공백이 온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 반도체 앞에서 원칙을 묻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 탈세 제보,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는 방법](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AI 시대, ‘한국형 ODA’의 새 기회](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07.29ff8ca49fc342629b01289b18a3a9ef_T1.jpg)
![[기자의 눈] 저당(低糖)과 딸기시루](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8.9437523556564053bbb620b7e1b1e0e4_T1.jpeg)